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최근 화학성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세제 등의 각종 생활용품의 경우 친환경 인증 제품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은 천연 유래 성분으로만 제조되거나 유기농 등의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부착해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생활용품은 ‘화학성분’ 미포함이 아닌 ‘환경 친화적’ 제품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제품’ 등의 환경부 부여 마크를 생활용품 등의 제품 용기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마크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증 제도다. 또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생활용품 등 제품의 환경성은 재료나 제품을 제조·소비·폐기 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따져 결정된다. 정부 기준에 부합해야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선 개선’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7개 범주로 규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다”라면서 “어떤 생활용품 제품이 함유한 화학성분이 물에 잘 녹는다거나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친환경 마크를 받는 기준에 맞도록 적었다면 그 제품은 친환경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인증 마크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인증이라기보다는 자연 환경 등에 미치는 오염 요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친환경’에 대해 체감하는 이미지는 실제 의미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인체에 ‘유익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마크를 부착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포함한 생활용품도 판치고 있어 보건 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다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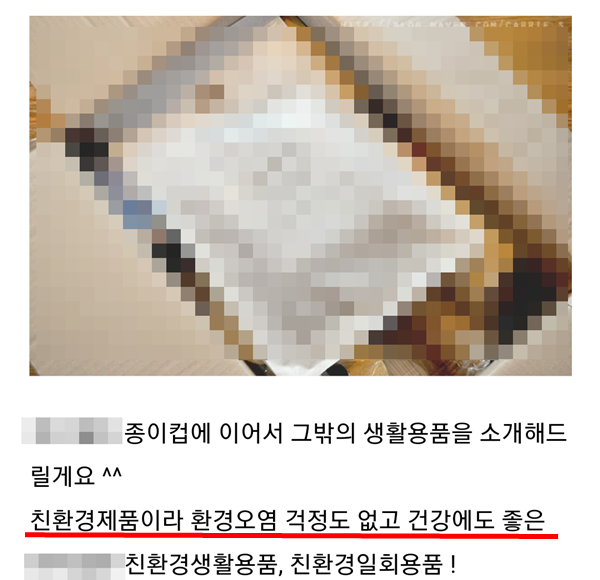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 조모(39)씨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 화학성분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기저귀도 천기저귀로 바꿔야 하나 생각 중이다. 생활용품을 살 때도 친환경 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면 좀 안심하게 되지 않냐”면서 “그런데 친환경 제품들도 결국은 화학제품이라 뭘 믿고 사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천연 유래 성분만으로 이뤄진 제품은 만들어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화학 성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천연’이나 ‘자연’ 등이 표시된 제품이 인기는 많지만 실제로 천연유래성분만으로 제품을 만들어 팔기는 쉽지가 않다. 원재료 자체 단가가 높기 때문”이라면서 “천연유래성분과 천연성분은 다르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천연 성분인데 그걸 가지고 생활용품을 만들 순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