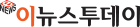![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탄소제로 & 수소환원제철 국회포럼’ 참석자들이 포럼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https://cdn.enewstoday.co.kr/news/photo/202511/2360069_1186953_3316.jpg)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창명 기자] 25일, 국회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탄소중립 및 수소환원제철 국회포럼’이 열렸다.
포항환경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이 어떤 전략으로 구조 전환에 나서야 하는지 집중 논의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조명종 포스코 미래철강연구소장, 한정석 탄소제로전국넷 공동대표,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의 가능성과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포럼은 “한국 철강 산업이 더 이상 기존 고로(용광로) 방식에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출발했다.
권향엽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과제”라며 “특히 광양–포항으로 이어지는 국내 철강 벨트는 한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전기로 확대와 수소 기반 전환에는 막대한 예산·전력·수소 공급망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명종 포스코 미래철강연구소장은 국산 기술인 HyREX(하이렉스)의 원리와 강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수소를 환원제로,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공정, ▲저품위 분광석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유동로–전기용융로’ 방식, ▲고철 수급 문제를 보완할 국산 철 원료 생산 기술, ▲슬래그 재활용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그는 “HyREX는 기존 석탄 환원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한국 철강사가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규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가 추진 중인 포항 실증사업 투자 규모만 8,1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조 소장은 “기술 개발은 시작 단계이며, 정부의 구조적 지원 없이는 산업화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수소환원제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산업 대전환 플랫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진국 사례를 들며 “독일·영국·일본·스웨덴은 이미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운영 중”이라며 “한국도 국무총리 산하에 ‘수소환원제철 전환청’(가칭)과 같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석 공동대표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면, 그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국가 산업경쟁력 유지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철강 부문 탄소감축 가능성 70~90%, ▲탄소중립 경제 체제로의 전환 가속,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 타격 우려, ▲수소·전력·산업 인프라 등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수소환원제철은 선진국조차 막대한 재정과 기술을 투입해야 겨우 진입할 수 있는 고난도 전략산업”이라며, 한국이 산업 전환에 뒤처질 경우 “철강 수출 경쟁력 상실은 물론 제조업 가치사슬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의 결론은 명확했다. ▲정부의 강력한 전담 조직과 재정 지원,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전력·수소 공급망 구축, ▲국민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업·정부·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 전환 등 참석자들은 “수소환원제철 산업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며 “탄소중립 시대, 한국 철강의 생존을 위한 대혁명이 시작됐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철강 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소환원제철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와 기술 전환의 당위성을 국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첫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정부 정책과 예산 편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