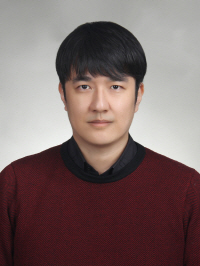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13일 새벽 서울 선릉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여성을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다. 오후 한 때 포털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이슈였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른’ 간단한 사건이었다. 범인은 즉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고 상해나 살인미수로 검찰에 넘기면 끝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자에게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 됐다. 사회부 사건 담당은 아니지만 ‘당직기자’로 주요한 이슈였던 만큼 전화로 사실확인이 필요했다. 담당 출입처도 아닌 서울 강남경찰서 전화번호를 홈페이지로 확인해 전화를 걸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확인만 하면 되지만 기자는 세 번이나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홈페이지에는 ‘형사팀’과 ‘형사지원팀’ 번호가 있었다. 경찰서 출입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커다란 공간 안에 형사팀과 강력팀 데스크가 있었고 입구에는 형사 데스크와 당직일지가 있었다. 형사팀 번호는 형사 데스크였던 모양이다.
첫 번째 통화에서 물었다.
“오늘(13일) 새벽 2시쯤 선릉역에서 새벽에 흉기 사건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형사 데스크 형사가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의 말투가 기분 나쁜 것은 아니다. 형사라는 사람이 그리 친절하지 않다는 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이후 해당 형사와 두 번 더 통화했다. 그 사이 역삼지구대와 해당 병원까지 전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결국 세 번째 통화에서 돌아온 형사의 대답은 “그런 건 강력팀에서 하는거다. 우리 시스템을 모르면 와서 확인을 할 것이지. 전화로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건 뭐냐”였다. 다시 말해 귀찮아서 두 차례나 대답을 대충 한 것이다.
이 대답 때문에 기자는 1시간 넘게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야 했다. 사회부 시절에 그랬듯이, 해당 형사 말처럼 뛰어다니면 금방 끝날 일이었지만 기자는 이날 ‘당직기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기자 수고는 그냥 웃어 넘기더라도 전화를 받은 형사는 굳이 전화를 두 번이나 더 받아야 했다. 그의 말대로 기자의 전화가 ‘사람을 괴롭히는 전화’였다면 첫 통화 때 “강력팀에서 담당한다”고 답했다면 더 통화할 일도 없었다.
귀찮은 전화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귀찮음 때문에 형사는 내 전화를 두 번이나 더 받아야 했다. 귀찮은 일을 당했을 형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전화 응대는 형사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피곤한 일이다. 기자도 마찬가지이며 기업이나 관공서의 홍보 담당자도 마찬가지다. 영업담당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귀찮음 때문에 사실 전달을 피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가는 일을 두 번 세 번 하는, 더 피곤한 일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잘못된 정보로 자칫 잘못된 기사가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확인에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 기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기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 독자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자는 형사에게 콜센터 수준의 친절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답변으로 혼선을 빚는 일은 막아야 한다. 경찰서는 공공기관이다. 공익 목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잘못된 답변을 준다면 민원인의 혼선은 불가피한 일이다.
강남경찰서에 민원이 있는 국민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 강남경찰서에 민원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할 때는 두 번 이상 확인을 하라고 말이다. 공공기관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른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언제 잘못된 답변을 해서 일을 더 곤란하게 만들지 모르니까 말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